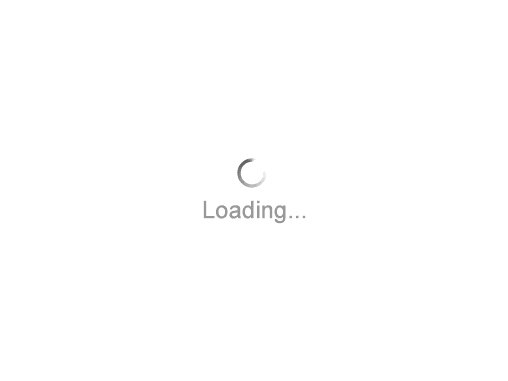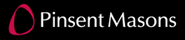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133
- 부엌을 포기할수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 미식가 (jph63)
-
-
 2,259
2,259
-
 0
0
-
 0
0
- 2003-12-26
-
본문
아침, 점심이야 한국도 이젠 그렇지만 저녁까지 아니 일요일 아침까지 온집안 식구들이 전부 나와서 밥을 사먹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었다.
“아침먹고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정말 돌아서기가 무섭게 때가 돌아 오네, 좀 안 먹고 살수 없나?” 하고 궁시렁거리던 엄마의 푸념
급식이 안되던 우리 학교시절엔 도시락까지 2-3씩 싸느라고 그야말로 머리를 싸매고 매일 무엇을 먹일까를 걱정하던 엄마와 그런 주변환경에 익숙했었는데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여성분들을 통채로 이민시키고 싶을정도로 정말 편리한 문화였다.
한국에서 날잡아서 하는 “외식”을 하루 세끼, 일주일 내내 한다는 것 아닌가??? 감격이다.
일하는 여자에게는 정말 만만세 인 것이다. 저녁때 퇴근을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푸드코트나 호크센타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집에서 풀어 먹고 설겆이도 할 필요없는 둘둘싸서 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여자가 할필요 없이 신랑이 사오는 경우가 더 많다니 여자는 그야 말로
룰루랄라 ~~~ 이다.
일요일 아침에도 남편은 늘어져서 자는데 여자만 혼자 바쁘게 좀더 색다른 것을 먹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 자리털고 일어나 이빨만 대충 닦은채 나란이 손 잡고 나가서 아쿤에서 버터끼운 가야 식빵을 먹던지 아니면 호크센타에서 죽을 유자께와 먹던지, 아이들 식성대로 멕도날이나 켄터키를 가던지 입맞대로 골라 먹으면 된다. 너무나 살맛나게 편하고 무진장 낭만적이지 않은가.
정말로 여자의 가사노동이 없이 식사를 해결할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황홀한 환경이다. 여자가 밥할 시간을 둘이서 같이 보내니 부부금실도 무진장 좋을 것 같고 적어도 한국처럼 여자가 밥하는 동안 남자가 빈둥거리고 있다고 싸울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 난 아직도 밥을 한다. 집에서 있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부엌에서 보내고 아직도 내 수첩에는 많은 요리방법이 적혀 있고 모처럼 쉬는 날에는 그중 하나를 시도해서 같이 가족과 나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부엌을 포기 할수 없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이다.
우선, 글쎄 내눈엔 부엌에서 해방된 여자나라에서 더 낭만적이고 더욱 분위기가 좋아야 할 싱가폴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았다. 유난히 까탈스러운 식성을 가진 아버지에게 불평이 많으시면서도 돌아오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가재미를 숯불에다 노릇하게 구워서 돌아오시는 시간에 딱 맞추어 보글보글 끓인 두부된장 찌게와 함께 들여와 옆에 착 붙어앉아서 밥위에 가시발린 생선을 얹어주시던 엄마를 바라보던 우리 아버지의 그 애정과 무조건적인 신뢰의 눈을 여자가 제대로 대접 받는다는 이나라의 남자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다. 애정의 밀도나 끈끈한 정의 정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나 할까, 이 나라 알랑미 처럼 언제든지 흩어지기가 가능한 – 인간관계에서 무언가가 빠졌다고나 할까
남편과의 관계는 어느정도 타협할수 있어도 나는 내아이와는 절대 같은 것을 즐기고 싶다. 그건 내 식성을 바꿔서 멕도날이나 켄터키같은 인스턴트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내 색갈과 식성대로 칼칼한 냄새의 고추장 찌게나 구수한 김치찌게, 위생상은 어떨지 몰라도 손가락으로 길게 쭉 찢어서 흰밥위에 얹어 먹는 갓김치, 보글된장를 끼얹어서 설설 비빈 아욱 비빔밥을 한 양푼 비벼서 코에 땀을 송송내면서도 서로 더 먹으라고 밀어주면서 내 아이와 먹고 싶다. 내가 엄마와 그랬듯이.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에도 어린 나는 따뜻한 부두막에 앉아서 엄마의 마술같은 요리과정을 보거나 파를 다듬으면서 엄마가 맛보라고 조금씩 집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엄마와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인지 내겐 부엌이 가사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유희의 장소라고나 할까 .
그 지겨운 사춘기시에도 엄마와 나는 무척 많이 다투었지만 언제나 다투고 나면 엄마는 “밥 해 먹자 “ 하고는 비듬된장 비빔밥이나 얼큰하게 끓인 김치찌게를 요리한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면서 말없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음식을 말끔히 비우는 것으로 엄마에게 못되게 군것을 사죄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야, 어딜가도 엄마가 끓인 김치찌게 보다 맛있는 것은 없어.” 하고 아양을 부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역만리 어디를 헤메더라도 된장냄새를 맡으면 자동적으로 엄마를 떠올리고
아무리 먼길을 거쳐도 꼭 우리 엄마만이 만들수 있는 엄마의 고추장 찌게 와 같은 절대 밖에 음식으로 대신할수 없는 어떤 공간과 냄새를 내 아이들과도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별로 음식솜씨가 없다. 그래도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잡채를 비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김치찌게를 끓여서 냄새를 온 동네에 풍긴다. 내 아이들이 찌게 냄새를 맡으면서 나와 나와 같이 보낸 어린시절을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나는 부엌을 포기할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

 글작성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