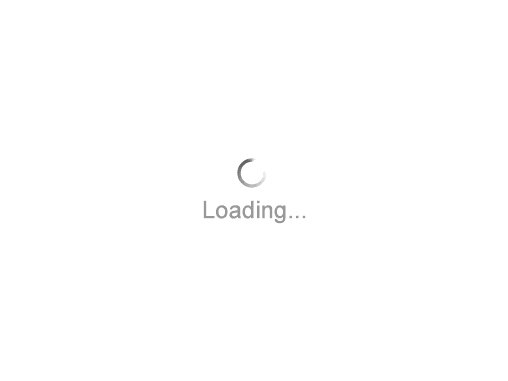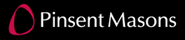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156
- 봄만 되면
페이지 정보
- 미식가 (jph63)
-
-
 1,507
1,507
-
 0
0
-
 0
0
- 2004-03-19
-
본문
저는 아주 죽겠는데.
벌써 3주째 죄없는 우리 신랑 만 달달 볶고 있어요…
사춘기는 벌써 강산이 두어번 바뀌기 전에 지나갔으니 절대 아닐거구
벌써 노망기가 온 것도 아닐거구,,, 그 무서운 갱년기…..흡
곰곰히 생각해 보니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로 순진한 우리 신랑을 협박한 것도 작년 이맘때였고
갑자기 사는 외국생활이 너무 힘들어 견딜수 없다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한국을 갔다오니라구 생활비의 거의 반을 거덜냈던것두 재작년 요맘때구.
유난히 술이 땡기는 것도 – 넘들이 들으면 엄청난 주당인줄 알겠지만
그리고 입맛이 없어지는 듯하면서 칼칼하거나 얼큰한 한국음식에 유난히 집착하는 것이랑,
무진장한 짜증과
이 허망함,
그리고 그리고 이 갈곳 없는 마음
그거보다 더 갈팡질팡하는 감정의 기복.
그런데다 이 빌어먹을 –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이상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는 또 왜 그렇게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오는지.
이 모든 증세들이 해마다 요맘때면 나타나는 복병, 봄 타는 것일거다.
처량도 하지요, 봄은 커녕 겨울도 가을도 없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365일 – 이름하여 아열대성 기후 지역에 살면서 봄이라니…..
아무리 설명해도 정신적 불균형으로 밖에 이해 못하는 이방인 속에서 봄앓이를 하다니…
하기야 어떻게 그 꽃피는 날의 설레임과 들뜸,
여름의 달락지근한 노곤함 , 장마끝의 찬란함
그 사부작사부작 낙엽지던 소리와 뚫고 날아가고 싶게 청청한 한국의 가을하늘
인간의 냄새와 온기가 함께 어우러 져서 더욱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살이 에리는 듯한 추위의 겨울
그와 함께 하는 한잔의 따뜻한 정종, 시원한 500CC 맥주, 골목에 자리 피고 골뱅이 무침에 꼴깍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가던 소주
그리고 음 , 그리고
감자탕이나 부대찌게를 부글부글 앞에서 끓여 서로 숟가락 부딪혀가며 먹는 사이사이 마시던 그 짜릿함을 어찌 설명할수 있을까……
우리 신랑은 그 정서를 이해 못한다는, 단지 그 정서의 무지함 때문에 내 삶에 깊이 들어 올수 없다. 나를 절대 이해 할수 없다.
아마 이순간도 내가 정신이 이상한 여자와 결혼 한것은 아닌가 혼자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Never mind ra.
한국을 떠난지 10여년이 되어가건만 아직도 내몸은 정확하게 사계절의 마디마디를 전부 밟고 간다. 신통해 해야 할지, 서러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국인임을 정말 눈물겹게 느끼게 해준다. 봄만 되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

 글작성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