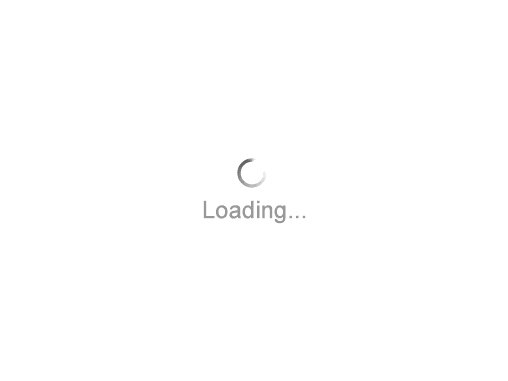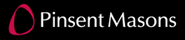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257
- 인연 1
페이지 정보
- 미식가 (jph63)
-
-
 1,888
1,888
-
 0
0
-
 0
0
- 2004-06-28
-
본문
옆에 자고 있어야 할 신랑이 어딜 갔나 했더니 거실에서 수화기 내리는 소리가 나고 곧 비틀거리며 들어와 꼬구라져서 잔다. 아 또 그여자 에게서 전화가 와서 잠결에 받고 들어왔구나.
요즘, 우리집은 이렇게 밤, 낮, 새벽, 이른 아침 할 것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린다. 나도 밤에 자다 일어나 전화를 받아보면 이나라(싱가폴)와 그나라(캐나다)의 시차를 생각지 않은, 아니면 그 것을 노리는 것인지, 모든 전화예절은 생략한 그리고 절대로 자다가 받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엉터리 영어로 생뚱맞게 들려온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6살짜리 아들이 전화 받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 신랑을 가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싱가폴로 보내버릴 테니 그럼, 신랑 둘 이랑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였나보다. 아들이 그랬다. 엄마는 신랑이 둘이란다. 깔깔깔..
아들은 철이 없이 들은 대로 떠들지만 어린아이 목소리가 분명한데도 거기다 대고 횡설수설한 그 사람은 도체 정신이 어떤 사람일까.
또 그랬단다, 이메일로 백번을 사과 하기 전에는 우리집은 물론 한국의 친정까지 계속 전화를 하겠다구.
글쎄, 사과라….. 무엇을 사과해야할까, 그리고 그분은 무엇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마음의 진정을 찾을수 있을까. 대체 자기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하는 걸까?
가끔 내가 전화를 받으면 다짜고짜로 “남편 바꿔요, 남편 바꾸란 말야, 남편” 하고 어거지를 부린다. 어찌 이분의 전화방법은 거의 십오년전이나 똑같이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이란 말인가.
십여년 전에도 야근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그랬었다.
“나, 아무개(상사이름)씨 부인인데요?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구 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누구씨가 왜 이시간에 거기에 있어요?”
“예? 일하는 중인데요?”
“아니, 여직원도 할일이 그렇게 많아요? 딴사람 들은 어디 있어요?”
이 대목에만 이르면 그때만 해도 회사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이상한 사명의식에 불타던 촌스러운 여직원이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옆에서 전화통화 내용을 대충 듣던 상사가 전화를 잡아채서 “왜 일하는 데 전화해서 방해냐,”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나는 잠시 밖으로 나와 버린다.
그러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린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일에 또 매댤렸었다.
왜 그렇게 일이 좋던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보고서 하나를 위해 컴푸터 앞에서 온밤을 하얗게 새우고 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같이 일한 상사의 말대로 ‘따끈따끈’ 한 보고서를 윗 분 책상에 얹어 놓을때의 그 성취감.
남들이 이틀씩 걸린다는 결재를 결재하시는 윗 분들의 업무형태와 유형, 기분상태까지 파악해서 반나절 만에 결재 완료 후 결재서류를 내 책상에 던질 때 느껴지던 그 만족감.
똑똑한 여자, 똑부러지게 일하는 여자, 남자직원 보다 휠씬 더 일 잘하는 여자.
이것을 위해 질주 하느라 밤중에 걸려오는 한 상사부인의 전화 따위는 너무 하찮았었다.
아니 그것에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바빴고 다른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았었다.
일에 중독된 것은 상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정말 환상의 조를 이루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었다. 일주일에 이틀을 밤을 새어 일하고 한번씩은 출장을 가는 살인적인 업무 스타일로 4년의 기간을 그렇게 일하는 동안 우리 부서를 맞는 윗 분들은 전부 영전이나 이사로 진급하는 행운을 누렸고 우리는 윗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나 하는 일군 이였었다고 자부한다..
지금도 가끔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 4년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붙어 지내면서 한번이라도 내가 상사를 남자로 느낀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사가 나로 하여금 여자로 느끼게 한적이 있었던가?
결론은 한번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 본적이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바빴고 또 둘다 일에 미쳐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이 너무 컸었다.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어떤 낭만적인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인정 받아서 단순한 여직원에서 일 잘하는 일군으로 뽑힐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상사도 빽 없고 이름 없는 지방대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깨는데 온 몸을 던져 머슴같이 일하는 형이 였었다.
우리 둘다 에게 남녀간의 달콤한 감정 따위는 감정의 사치 였다고나 할까. 두 지방대 출신의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싸움은 너무 처절해서 딴 것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남녀 관계보다도 더 짜릿하게 사는 맛을 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느라 서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

 글작성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