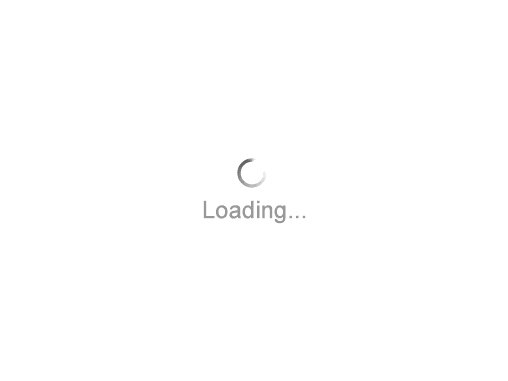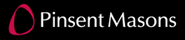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65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 미식가 (jph63)
-
-
 2,369
2,369
-
 0
0
-
 0
0
- 2003-09-11
-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동화 한편이다. 어릴땐 그냥 재미로 또는 남에게 나쁜짓을 하면 꼭 그 대가를 치룬다는 권선징악의 교육용으로 들었는데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서 삶의 진쪽을 느끼면서는 슬슬 이 동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생겼다.
왜냐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부부에게 내려진 벌로는 너무 황홀한 벌이기 때문이다. . 이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것보다 황홀한 경험이 있을까? 아직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극적인 오르가즘을 느낀 순간들을 대라면 놀랍게도 나의 직업에서의 성취감이나 아콩다콩한 연애나 결혼이 아닌 전부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다.
왜냐면 딴것들은 내 의지가 만들어서 내가 만족을 느낄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서 그런지 자칫하면 피곤하기 쉬운데 반해 아이들과 접한 부분은 내 노력이나 의지보다도 더 큰 무엇이 끊임없이 나를 덥는 것같은 풍부함으로 금방 끝날것 같은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건 나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엄청난 세계로의 여행이므로…..
처음 고놈을 내 애기집에 받는 순간에서 부터 그 현미경으로나 봐야 한다는 그 무엇이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를 엄마인 나에게 느끼게 해 준다. 마치 ‘ 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이.
입덧을 해서 말라죽어가는 동안에도 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이 경이롭고 가슴이 뻐근하도록 벅차다. 가끔 의사가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그 조그만한 올챙이 모양의 무엇이 내겐 20여년을 키워준 부모보다, 형제보다 어떤 친구보다 아니 신랑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이제 드디어 혼자가 아닌 것이다.
배속에서 축구를 하는지 가깝해서 그런지 조금 큰 태아가 배속에서 발길질을 할때의 그 느낌.
오랜 산고 끝에 그 놈을 밀어냈을때의 그 큰일 을 한 것같은 성취감.
쪼골쪼골한 쥐같은 모양의 그 얼굴 – 도무지 이쁘다고 할수 없는 ET 인데도 보는 순간 그냥 반해 버린다.
가끔씩 눈을 반쯤씩 빼꼼이 떠보일때는 극치의 오르가즘에 주책없이 아랫도리가 촉촉해 진다.
아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지가 내 배속에서 나오는 것을 비디오로 담아서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게 기댄다.
한번도 계산이나 거리감없이, 조건없이 철떡 믿어주던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아이말고 또 있을까?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환경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하다못해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항상 깊은 골을 느끼면서 추운 겨울 속 같았던 내인생이 한 조그만한 아이의 절대적인 믿음앞에 갑자기 무진장 자신이 생겼다. 나도 무엇인가를 한것이다. 그리고 또 무언가 할것이 있다.
그것은 두렵지만 아름다운 짐이다.
나는 아이에게서 매일매일 기적을 본다. 조그만한 것이 지 손을 보고 경탄하고 지 발을 잡고 논다.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일어나 앉고 걷는다. 하는 말을 따라 하고 나중에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를 나름대로 혼자 정리해서 말한다. 엄마가 그 진도에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나하나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지 않은가?
그 까만 눈동자가 깜빡이면서 생각을 굴려 기막히게 아이다운 생각을 내뱉을때 내 삶은
단풍든 가을산 처럼 화려해 진다.
시들해지기 시작한 내 인생 - 놀만큼 놀고, 살만큼 살고 난후에 오는 권태와 다 그런거지 뭐 하는 생각의 늙음 - 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수 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트리가 찬란해 진다.
산타가 살아돌아오고, 세상때에 끼여서 죽었던 동화들이 살아 돌아온다. 다시한번 배추벌레와 거미줄에 걸린 거미와 각각 색갈이 틀린 개구리와 친구가 된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아름다움과 무서움과 친근함을 같이 하다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의 동지가 되어있다.
" 너는 엄마를 사항해 안해" "사랑해" 이럴땐 유행가가사에서 드라마에서 하다못해 신랑입에서 하도 들어서 식상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내 인생을 다시 비춘다. " 얼마나 사랑해""이만큼, 이만큼" 하면서 양손을 활짝 펼치는 아이를 덥석 안으면서
그래,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수도 있다 라는 삶의 충만감을 느낀다. 정말 누구를 위해 계산없이 죽을수 있을만큼의 그 누구를 내 인생에 가졌다는 것 만으로 내삶은 이미 넘치도록 행복한 것 아닌가? 아이가 멀리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하고 달려와 콱 안길때 마다 나는 더이상 완전해 질수 없는 인생의 절정을 맛본다.
거기에 이아이가 커서 뭐가 되고, 공부가 어떻고 등의 쓸데없는 욕심을 끼워넣을 데가 없다. 또한 그런 아이를 위해서는 몇년씩 입는 낡은 옷을 꺼내입어도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적이 함께 하므로.
이렇게 아이가 한살이면 일년동안의 기쁨을, 5살이면 5년동안의 기쁨을, 10살이면10 년동안의 기쁨을 굽이굽이 누린다면 그 주막부부는 세 아들이 안겨주는 축복을 장가갈때 까지 누렸다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절대 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어찌 아들이 일찍 죽어서 더 길게 자식둔 재미를 누리지 못했다고 그것을 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식은 이미 있는 그대로, 그 나이만큼의 넘치는 하늘의 축복인 것을.
그래서 나는 이동화는 넘치도록 재복과 자식복을 가진 부부를 시기해서 만든 어른들의 –그것도 욕심이 드글드글한 -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 인간의 본성 있지 않는가? 남이 잘되면 배 아프고, 그러다가 안좋은 일이 벌어지면 “ 내 그걸줄 알았어. 잘될때 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아봤어” 하는 삐딱한 본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

 글작성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