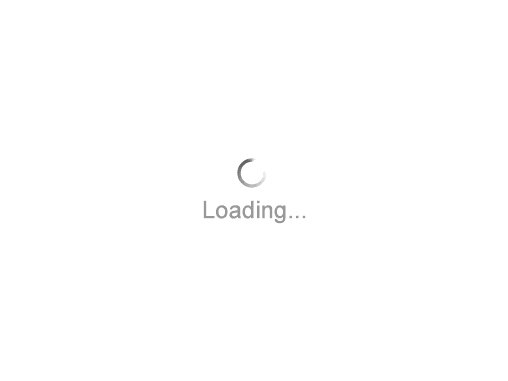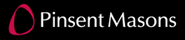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277
- 문화
-
환율에 대한 오해들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4,139
4,139
-
 0
0
-
 0
0
- 2004-11-23
-
본문
① “달러 언제 사야 하느냐”고 엉뚱하게 묻는 투자자들
한화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홍 팀장은 한시간이 넘도록,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오래 지속될 걸 알아야 재테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나온 첫 질문은 “그러면 달러를 언제 사야 하느냐”는 것. 홍 팀장은 “황당해 입이 안 떨어졌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1980년 중반 엔·달러 환율이 200엔대에서 80엔대까지 떨어졌다”며 “당시 일본의 자산가들은 달러를 사놓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과연 달러 자산이 3분의 1 토막난 뒤에도 그들이 자산가일까”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달러에 대한 광신(狂信)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1월24일 1085원이었던 환율은 한달만에 1962원으로 뛰었다(원화 가치 폭락, 달러 가치 폭등). 한국 경제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대기업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한국 경제가 그 때 만큼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들의 차입 경영 상황의 경우, 비교 가능한 445개사의 부채비율 평균은 지난 97년 301%에서 올9월말 현재 88%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갑자기 달러가 폭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유럽, 일본 등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자국 통화의 강세를 우리만 안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문가들은 “누가 뭐래도 달러를 사고 싶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조금씩 나눠 사라”고 조언하고 있다.
② 환율 하락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경제 교과서에 써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를 떨어뜨려 국내 물가를 하락시키고, 기업의 외채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밝은 면을 갖고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만약 원·달러 환율이 이전에 떨어졌다면, 자영업자들이 솥뚜껑을 덜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진다. 한국은 식료품 원자재, 원유 등 거의 모든 원료를 수입한다. 따라서 환율 하락은 물가 하락을 뜻하고, 이는 곧 내수가 좋아지는 요인이다. 물론 수출 없이 수입만 계속 해대면, 국가 부채가 쌓이고 국가 경제는 박살난다. 또 한국의 내수 불황은 2002년의 카드 거품에 주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물가가 떨어져도 내수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수출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과열을 막을 수 있다면, 환율의 적절한 하락은 내수에 호재임에 틀림없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심지어 한 기업 내에서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부서는 환율 하락의 혜택을 보고 제품을 수출하는 부서는 힘들어진다”며 “환율을 한 방향에서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③ 10%의 환율 하락이 10%의 수출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환율 하락은 보통 수출경쟁력의 감소로 표현된다. 그러나 수출이 환율이 떨어진 비율 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환율 하락=수출 경쟁력 감소’의 논리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가격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 국가의 기업에 밀린다”는 것. 동원증권 조홍래 부사장은 “제품의 가격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환율이 떨어질 경우 수출 물량은 그대로 있고 수출 가격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액은 물량에 가격을 곱한 것이고,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독점 제품이거나, 고객들의 충성심이 높은 제품을 뜻한다.
즉, 환율 하락에 따라 비싸진 원가를 가격에 전가시켜도 환율 하락 이전과 똑같은 물량이 팔리면, 수출액은 증가한다. 결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 조 부사장은 “1980년대 중반 엔·달러 환율이 폭락했을 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인기 절정에 다다르면서 더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출은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다른 말로 하면 세계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다.
물론, 기술 경쟁력 없이 가격 경쟁력만으로 버텨왔고 외환 위험 회피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사실 이 점이 바로 환율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이다. 국내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④ 정부가 개입해도 대세는 못 바꾼다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달러 약세를 강세로 돌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는 없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려고 할 뿐이다.
명지대 윤창현 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는 “1997년 외환 부족에 시달리던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못 가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달러가 점점 부족해지는 바람에 개입을 포기했고 얼마 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의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무리하게 개입하다가 실탄을 다 소진해서 환율 변화를 더 급격하게 만드는 것은 1997년과 방향만 다를 뿐 똑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자신의 실력에 대해 과대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개입을 하느니 차라리 그 자금을 수출 기업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⑤ 환율 하락이 곧 주가 하락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수출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가총액에서 수출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원·달러 환율과 종합주가지수의 추이를 보면, ‘환율 하락=주가 하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외국계인 UBS 증권은 최근 “IMF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하락은 3번의 예외를 빼고는 종합주가지수와 정비례의 관계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종합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정호 투자전략팀장은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5개사를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매출의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라며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는 것이지, 종합주가지수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2004.11.23 조선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