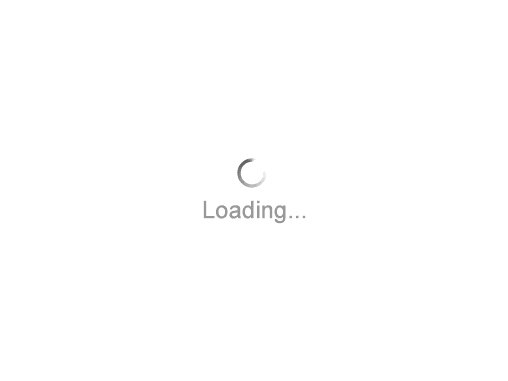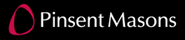- 6,692
- 몸살림운동
-
김철의 몸살림 이야기<4>

페이지 정보
- 앤디0312 (cbyong)
-
-
 540
540
-
 0
0
-
 0
0
- 2013-08-13
-
본문
김철의 몸살림 이야기<4>
나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하루에 한끼만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고 허기가 져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도사 아니냐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기가 지지도 않고, 더더구나 나는 도사가 아니다. 다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때로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점심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점심 때 만나게 되면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한다. 상대는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멀뚱멀뚱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먹던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속이 아프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스님과 만난 첫날 밤을 나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이것도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내 성격이 너무 예민한 탓에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깨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룻밤에도 네댓 번씩 깨고 자고를 반복했다. 나는 이것을 타고난 성격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하게 자고 나니 일어나서 몸이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전날 스님께서 온몸을 교정해 주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아 곤하게 잠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자기 자신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몸이 틀어져 있으면 몸은 불편한 것이고, 몸이 불편하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마련이다.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 설사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 없다고 해도 몸이 틀어져 많이 아프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하물며 드러난 병이 있는 병자가 쉽게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몸이 바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몸살림운동에서는 “가슴을 펴자! 마음이 열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놈의 영감쟁이’(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에는 실제로 스님을“영감”이라고 불렀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부르면서 생각을 했다)가 아침밥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궁이에 불을 때야 밥이 될 텐데, 쌀 씻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던 나로서는 속에서 꼬르륵거리며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장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체면이 있어 참았지만, 해가 중천으로 올라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감, 밥 안 줘?”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아침 안 먹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때까지 기다려” 하시는 것이었다. 아니, 살아 있는 사람이 겨우 한 끼만 먹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그리고 저는 안 먹더라도 손님인 나한테는 밥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손님으로 와 있는 주제에 이 움집을 다 뒤져서 식량을 찾아낼 수도 없었고, 또 설사 찾아냈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밥 지을 줄을 몰랐다. 참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참다 보니 공복감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스님께서는 밥은 짓지 않고 물에 불린 종콩(메주를 쓸 때 쓰는 노란 콩) 20~30개와 솔잎 몇 개, 구운 감자 하나를 주셨다. 이걸 먹으라고 주다니, 내가 닭도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참 한심한 노릇이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니 또 역시 참고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종콩과 함께 솔잎을 주신 것은 종콩은 물에 불려도 비린내가 나는데, 솔잎과 함께 씹으면 그 비린내를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때에는 몰랐지만, 그래도 스님께서는 내게 배려를 해 주신 셈이었다. 콩의 비린내는 며칠 적응하다 보니 저절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끼 식사가 시작됐는데, 한 1주일쯤 지나자 몸에 기운이 빠져 운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말하자면 허기(虛氣)가 진 것이었다. 배가 고픈 증세를 넘어 속이 비어 허전한 상태가 된 것이었다. 이런 나를 보고 스님께서는 아껴 두셨던 들기름을 주셨다. 아침마다 들기름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가득 따라 먹으라고 주셨다. 처음 먹을 때에는 속이 역해 마시고 나서 솔잎을 씹었지만, 이것도 며칠 지나니 참을 만해져 솔잎과 함께 먹지 않아도 되게 됐다.
열흘 정도 먹고 나서는 “이제 됐다”고 하셨다. “이놈아, 이제 1년 정도는 속이 든든할 거야”라고 하셨다. 이 들기름 요법은 고기를 먹지 않는 절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방법이었다. 고기를 먹지 않아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못하는 스님들이 속이 허해지면 대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허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이 모 박사라는 분이 TV에 나와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선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지금도 채식이 거의 만병통치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식을 몇 년 동안 했더니 육식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채식을 오래 하면서 몸이 채식에 적응한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육식만 하던 사람은 채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수행하기 위해 채식을 하더라도 들기름으로 보충을 하였듯이, 육식을 하는 사람도 채소는 함께 먹는다. 이는 우리 몸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잡식동물로 자리를 잡았다. 채식, 육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 왔던 것이다. 나는 어느 한 편만을 먹게 되면 고른 영양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일례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물리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한 끼 식사는 건강을 해치는가?
한 달 정도가 지나니 평상시에 느끼던 공복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인간의 몸은 여자의 월경과 마찬가지로 해보다는 달의 영향을 받아 주로 달의 주기를 많이 따른다. 우리 몸의 생체리듬은 주로 달의 주기를 따르는 것이다. 교정을 하고 몸이 제대로 회복되는 데도 한 달 가량이 걸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한 끼 줄일 때에도 공복감을 극복하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렸던 것이다.
이후 30여 년을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왔다. 그렇다고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오대산 자락 스님의 움집에서 나온 후로는 감자 한두 개, 콩 20여 개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밥 한 그릇에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게 됐다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필자가 종종 반찬까지 비우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한 끼밖에 먹지 않으니 허기가 져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스님과 함께 살면서 음식은 귀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남기면 죄를 짓는 것 같아 억지로 다 먹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음식의 양으로 친다면 컵라면 한 개로 때우기도 하고, 튀김 서너 개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허기가 지지는 않는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글자판(키보드)하고 씨름하는 게 노동의 전부인 사람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건강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도사가 아니듯이 무슨 도사라야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요새 몇몇 제자가 하루 한 끼를 먹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사실 요새 사람들은 영양과잉 상태에 있다. 영양이 과잉되면 생명체인 우리 몸이 알아서 과잉된 영양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세 끼를 꼬박 챙겨 먹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든 사람이 세 끼를 먹게 된 것은 소위 ‘근대’라는 시대를 맞게 되면서부터였다.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뇌에 필요한 당이 부족해 수업할 때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사람이 생명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당은 항상 몸에 저장돼 있고, 필요한 당은 그때그때 꺼내서 쓰게 돼 있다. 모자라면 몸이 마르고, 넘치면 몸 밖으로 내보게 돼 있다. 오히려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밥을 먹으면, 밤새 쉬고 있던 위가 부담을 느껴 속이 더부룩해지게 된다. 일어난 후 1~2시간 지나 위가 활동성을 회복한 다음에 먹어야 속이 편한 법인데, 요새 공부에 쫓기는 학생들은 일어나면 바로 세수하고 눈 비비면서 아침밥을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한다느니 아침을 먹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그것이 편하게 돼 있다. 한 끼를 줄이려면 한 달 정도의 공복감을 참아 내야 한다. 힘든 일이다. 즐겁게 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억지로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하든 허리를 바로 세우고 가슴만 제대로 펴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끼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위가 놀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1일2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끼를 더 줄이려고 한다면, 저녁만 먹으라고 권하고 싶다. 잠을 자기 직전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지만, 밥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 소화가 다 되고 나서 잠을 자면 위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체리듬에 맞는 방법이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
알림 (0)
 쪽지 (0)
쪽지 (0) 뉴스레터 (0)
뉴스레터 (0) 로그인
로그인 추천(0)
추천(0)
 글작성
글작성